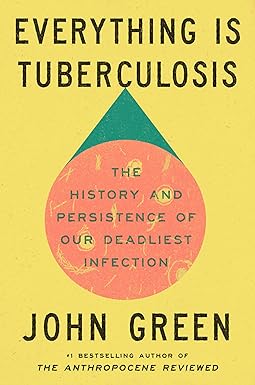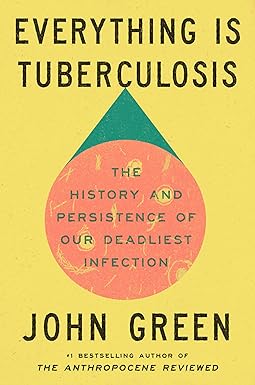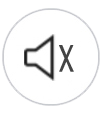인류 최악의 감염병을 다시 마주하다
병이 아닌 선택의 결과
결핵은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다. 이는 단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의 실패가 낳은 집단적 비극이다. 공기 중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특정 국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결핵은 우리가 만든 질병이다(It is a disease we made)."
결핵에 대처하는 방식은 질병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전염병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을 다룰 시스템의 부재, 약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평등, 정보와 치료에 대한 차별이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있다. 실제로 결핵은 오늘날에도 매년 13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는 에이즈보다도 많은 수치다.
"결핵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 지속된다(TB continues not due to lack of technology but lack of political will)."
역사와 문화 속 결핵의 그림자
결핵은 한때 "낭만적인 죽음"으로 불리기도 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창백하고 마른 얼굴, 가늘어진 손목, 침묵 속의 기침이 오히려 예술적 고통의 상징으로 소비되었다. 작가, 시인, 음악가들이 결핵에 걸렸고, 그들의 죽음은 비극이자 전설로 남았다.
"결핵은 병이 아니라 미학이 되어버렸다(Tuberculosis became not a disease, but an aesthetic)."
이러한 문화적 왜곡은 실제 공중보건에 해악을 끼쳤다. 미국의 콜로라도스프링스가 결핵 요양지로 부상한 것도 흥미로운 사례다. 깨끗한 공기를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주했고, 이는 도시의 형성과 산업 구조까지 바꾸었다. 위생 개념과 패션, 심지어 가구 디자인까지 결핵과 연관되어 발전했다. 결핵은 단지 병원에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스며든 문화적 코드다.
헨리의 이야기와 개인의 고백
시에라리온에 사는 소년 헨리의 삶은 결핵에 대한 통계를 구체적 현실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는 결핵에 걸려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약이 있어도 그것이 몸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장벽을 마주친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사례로 소비되지 않고, 전 지구적 구조 속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
"헨리의 고통은 그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했다(Henry’s pain was not just his country’s problem?it was mine, too)."
병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인간관계와 정체성에 주는 영향이 더 깊을 수 있다. 사회가 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은 달라진다.
"헨리와 나는 다르지만, 병 앞에서는 인간으로서 같은 약함을 공유하고 있었다(Henry and I were different, but we shared the same vulnerability in the face of illness)."
과학을 넘어서는 서사
결핵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온 질병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것이 왜 계속되는가에 있다. 결핵균의 병리학적 특성과 더불어, 현대 의학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의 한계가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몇 분 만에 진단 가능한 기술이,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현미경 검사를 쓰고 있다(We diagnose TB in minutes in wealthy countries, but in poorer ones, people still use microscopes)."
베다퀼린과 같은 신약이 있음에도 약물 내성 결핵이 확산되는 이유는 치료 실패율, 불완전한 복용, 제약사의 독점 때문이다. 이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국제 보건 체계의 실패다. 병의 지속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결핵과 싸우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박테리아가 아니라 기업의 독점일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베다퀼린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장치를 동원한다.
"약은 있는데, 줄 수가 없다(The drug exists, but we cannot give it)."
이 약은 약제 내성 결핵 치료에 핵심적이지만, 특허 보호로 인해 가격은 오르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접근성은 떨어진다. 진단 기기를 제작하는 Cepheid사의 카트리지는 수천만 명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비싸서 외면받는다.
"진단이 가능한데도 수백만 명이 여전히 진단받지 못하고 있다(Millions still go undiagnosed even though diagnosis is possible)."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가격 인하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는 지식과 행동이 연결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병은 결국 인간의 이야기
통계는 숫자지만, 질병은 사람이다. 숫자는 익명성을 만들어내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 안에서 낙인과 외면을 견뎌야 한다.
"결핵은 보이지 않는 이들을 더욱 투명하게 만든다(TB renders the invisible even more invisible)."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둔 소녀, 가족을 전염시킬까 두려워 방에 틀어박힌 청년, 약을 기다리다 죽은 어머니. 이들은 감염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라진 인간의 이야기다. 병은 고립과 두려움, 부끄러움의 형태로 다가온다. 질병을 마주보는 것은 결국 사람을 마주보는 일이다.
마주보고, 행동해야
결핵은 과거의 병이 아니라, 오늘의 병이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감염병이며, 기술이 있음에도 우리가 끝내지 못하고 있는 병이다. 이 현실을 마주하는 일은 단순한 인식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정보와 통계를 넘어서, 우리는 행동의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결핵은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병이다. 우리가 원한다면(TB is a disease we can end?if we choose to)."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정치적 의지다. 결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실천적 방법?진단 기기 보급 운동, 환자 권리 보호 서명 캠페인, 제약사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 등?은 단지 상징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다. 지식은 윤리적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결핵이라는 질병은 독립된 세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구조, 제도 안에 놓여 있는 현실이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한 시간 속에서 자라난 결과다.
"결핵은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병이다. 우리가 원한다면(TB is a disease we can end?if we choose to)."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독자는 책 속에 담긴 실천 목록을 통해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후원 단체 참여, 진단기기 보급 운동,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핵 종식에 동참할 수 있다. 지식은 실천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결핵은 여전히 하루에 3,5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는 감염병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비극이 아니다.
"결핵은 끝낼 수 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기 때문이다(TB can be ended. It is not a natural disaster, but a human choice)."
결핵은 구조적 선택, 제도적 무관심, 윤리적 외면이 만들어낸 결과다. 기술과 지식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남은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상상력과 용기다. 인간의 고통을 수치가 아닌 이름으로 기억하고, 침묵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회가 가능하다면, 결핵도 끝낼 수 있다.